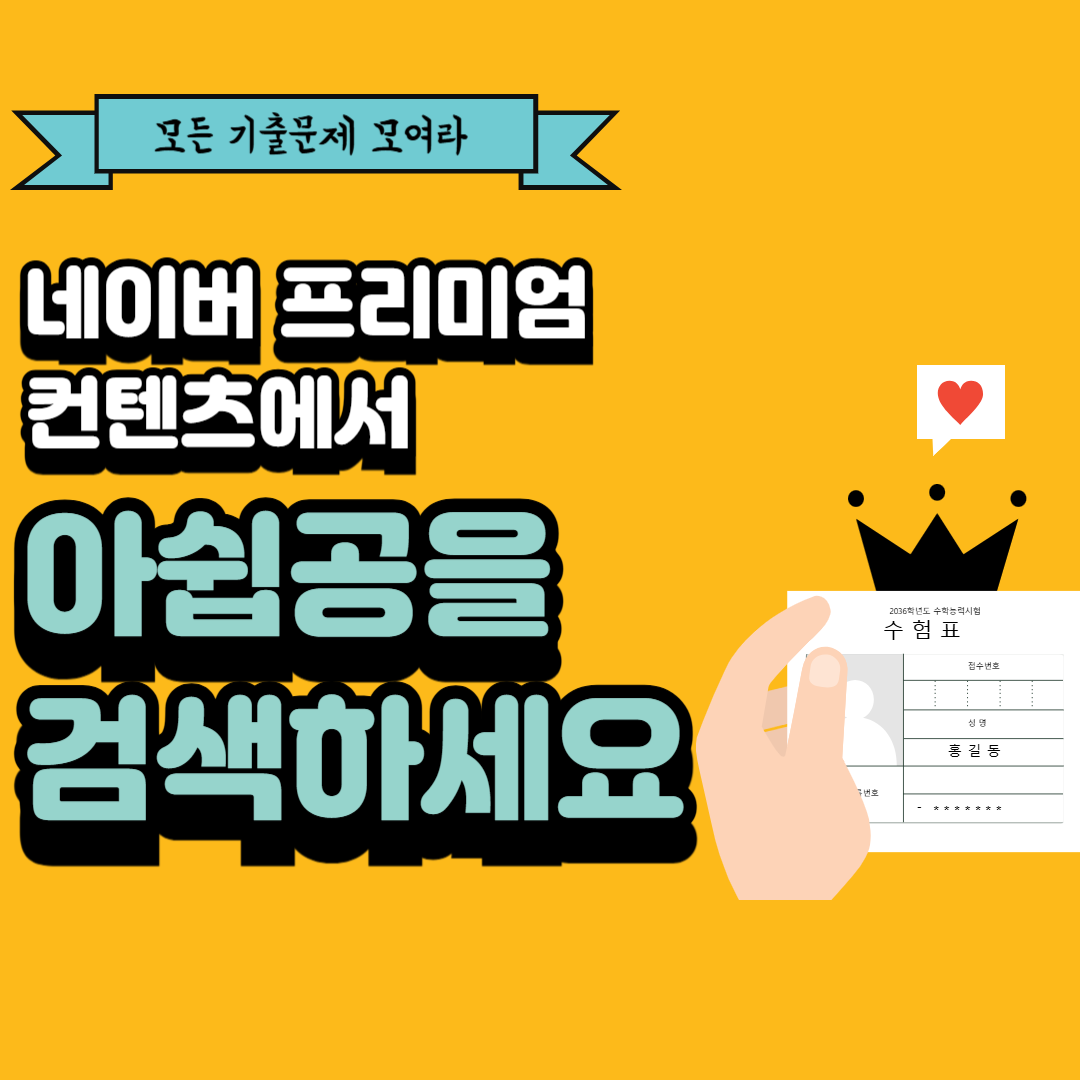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이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1.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할 수 있다.
③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적부심사를 행하여 청구의 이유 유무에 따라 청구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 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있다.
⑤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O)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② (X)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규정한 같은 법 제214조의2에서 체포와 구속을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4항에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4조의3 제2항의 취지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④ (O)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⑤ (O)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② 제214조의2제5항(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12.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⑤ 공소제기 후 구속·압수·수색 등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③
① (O)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54
② (O) ③ (X)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④ (O)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⑤ (O)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13.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관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의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만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폭행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인정되는 사실과 공소사실을 대비하여 볼 때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②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③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 한 상습사기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⑤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답 ①
① (X)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 달려드는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파열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관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의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심법원이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는 사실과 공소사실과를 대비하여 볼 때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② (O)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516
③ (O)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331)
④ (O)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463
⑤ (O)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14.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
③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할 필요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피고인 측으로부터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라는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 공판절차가 진행된 결과 증거조사가 마무리 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① (O)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② (O)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③ (X)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검사는 가능한 한 공소제기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④ (O)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⑤ (O)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15.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②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판기일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지 않다.
④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먼저 신문하였다고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① (O)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② (O)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③ (X)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77조 본문에 규정된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265).
④ (O)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⑤ (O)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16.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습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상습성을 부인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에서 증거동의가 의제된 사실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④ 간이공판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는 사실상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러한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때만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X) 제1심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거나 또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음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임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습상해 내지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② (O)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③ (X)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가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④ (X)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X)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17. 증거와 증명에 관한 <보기>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알맞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ㄱ.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ㄴ.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ㄷ.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ㄹ.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ㄴ (○) ㄷ (×) ㄹ (○)
③ ㄱ (○) ㄴ (×) ㄷ (×) ㄹ (○)
④ ㄱ (×) ㄴ (○) ㄷ (○) ㄹ (×)
⑤ ㄱ (×) ㄴ (×) ㄷ (○) ㄹ (○)
정답 ①
ㄱ (×) 형법 제6조 단행에 규정한 바 "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 하는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른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73. 5. 1. 선고 73도289)
ㄴ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2374)
ㄷ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ㄹ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18.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절차에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 행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⑤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정답 ③
① (O)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
② (O)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③ (X)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폭언과 강요,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④ (O)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⑤ (O)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19.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deposition)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소정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서류가 다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된다.
④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④
① (O)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② (O)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③ (O)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8200)
④ (X) 현행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증언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⑤ (O)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20.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②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수사보고서 안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사법경찰관이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여 한 진술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피해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⑤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 전부와 변호인의 반대신문사항 중 절반가량에 대하여 진술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속행되었으나, 그 이후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소재불명의 상태가 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정진술과 그 증인신문조서 그리고 검찰,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③
① (O)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② (O)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③ (X)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그 안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은 법 제311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기재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④ (O)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참조
⑤ (O) (대법원 2022. 3. 17. 2016도17054)
21.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증거동의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라도 피고인의 명시적인 동의 의사가 없는 이상 증거동의가 간주될 수 없다.
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판결 외에 심리도 가능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① (X)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 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② (O)(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07).
③ (X)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 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 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139).
④ (X)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는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으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의 출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고 공판심리의 일환으로 증거조사가 행해지게 마련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 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같은 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 점, 위 법 제318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재판의 필요성 및 신속성 즉, 피고인의 불출정으로 인한 소송행위의 지연 방지 내지 피고인 불출정의 경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결정하지 못함에 따른 소송지연 방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위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
⑤ (X) [가]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
[나]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22.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이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라면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사본을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⑤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그 제시된 증거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③
① (O)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② (O)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③ (X)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④ (O)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⑤ (O)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23. 일부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인의 상소는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전부에 미치는 것이므로 무죄부분도 상소심에 이전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② 항소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더라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④ 경합범의 일부유죄, 일부무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해 상소한 경우에는 무죄부분은 분리확정되고 유죄부분만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⑤ 경합범의 일부유죄, 일부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한 경우에는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고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정답 ①
① (X) 환송 전 항소심에서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없는 것이고,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위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은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② (O)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③ (O)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2733
④ (O)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6도18553).
⑤ (O)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40).
24. 항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55조에서 재소자에 대한 특칙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중에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를 빠뜨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① (O)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O)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③ (O) (대법원 1994. 3. 10.자 93모82).
④ (O) (대법원 2018. 1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⑤ (X)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는 피고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런 경우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도 항소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25. 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③ 상고의 제기가 법률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정답 ⑤
① (O)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② (O)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분리) 전원합의체
③ (O) 형사소송법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①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O)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⑤ (X)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373조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권 행사로서 갖는 공통성,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불복의사,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의 취지 및 그에 대한 제한의 범위와 정도,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도 항소심에서는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기출문제 해설(형법) > 기출문제 해설(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2) | 2025.03.12 |
|---|---|
| 2025년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0) | 2025.03.11 |
| 2025년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0) | 2025.02.20 |
| 2024년 시행(74기) 해경간부 형사소송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2) | 2024.12.13 |
| 2024년 시행(74기) 해경간부 형사소송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6) | 2024.12.11 |